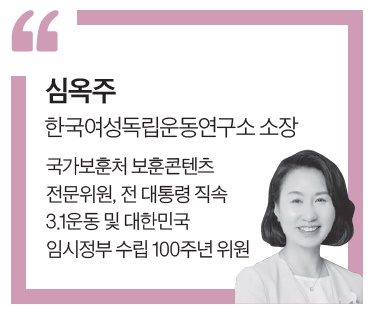[여성독립운동가] 2. 발굴과 서훈의 딜레마
국가보훈기본법 1조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발굴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여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발굴하고 훈격을 부여하는 것은 광복 70년이 지난 뒤에야 진행됐다. 왜 광복 70주년, 3.1운동 100주년에야 부각되기 시작했나,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성독립유공자, 1960년대의 28배 발굴
2021년 현재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여성독립운동가는 540명이다. 불과 8년 전만해도 절반인 226명이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상자 활동을 조사하고 포상심사 검증을 거친 뒤에야 훈격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보상 및 예우로 이어진다. 여성독립운동가의 최초 인정은 1962년 남자현·김마리아·안경신·유관순·이애라 서훈부터 시작됐다. 그들을 포함해 1960년대는 18명, 1970년대 3명, 1980년대 1명으로 소수만 인정받았다. 광복50주년을 기해 여성독립유공자 수는 급격히 증가해 1990년대 140명이나 인정받았지만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우선되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발굴 수는 증가했지만 여성을 민족과 역사의 아이덴티티 주체로 보거나 실천주체로 바라보지 못했다.

기준을 잃은 여성 서훈 딜레마
백범 김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문화의 힘을 강조한 바 있다. 광복 70주년이었던 2015년의 독립문화는 독립운동 변방의 존재였던 여성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놓았다. 역사의 뒤 안에서 독립운동 뒷바라지의 주인공이었던 여성을 독립군·광복군·단체대표로 활동주체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영화를 통한 문화의 힘이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기점으로 정부 주도의 발굴로 여성독립유공자의 수도 증가했다. 하지만 서훈기준에서 다시 한번 장벽에 부딪쳤다. 서훈기준의 ‘차이’는 여성독립운동가의 서훈기준에 적용되지 못했다. 과정적 접근(process approach)의 다각화를 통한 사료발굴과 데이터구축보다 발굴 수에만 집중하면서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 인정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정부·전문가 연계, 여성발굴시스템 갖춰야
그러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여성독립운동가 발굴이 서훈의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한 촘촘한 발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활동자료의 규명, 활동궤적 추적, 인물 간 연계 활동탐색, 사료와 함께 유물조사탐색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근대화·사회제도의 틀을 넘어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여성 활동을 바라보는‘차이’ 인정도 요구된다. 독립운동가의 동지였고 어머니였고 가족이었던 여성은 ‘다름’이 아닌 ‘차이’를 통해 발굴시스템을 갖추는 여성서훈기준의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