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 베유의 『중력과 은총』
윤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펴냄

‘어째서 한 인간이 다른 누군가를 조금이든 많이든 필요로 한다고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멀어지는가? 중력.’
삶을 관통하는 개인적 성찰을 담은 잠언집은 주로 남성의 몫이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 라 로슈푸코와 쇼펜하우어의 ‘잠언록’,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 등. 시몬 베유(1909~1943)의 ‘중력과 은총’(윤진 옮김, 문학과지성사)은 이런 남성 중심 사회에 나온 여성 철학자의 잠언집이라는 점만으로도 이채롭다.
시몬 베유는 ‘이방인’과 ‘페스트’의 작가 알베르 카뮈로부터 "우리 시대의 유일한 위대한 정신"이라는 얘기를 들은 프랑스의 철학자 겸 작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엘리트로 스물두살에 아그레가시옹(교사· 교수 자격증)을 땄지만 안온한 생활을 마다하고 전자· 철강 노동자로 일했다. 또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고 2차대전 중 프랑스 레지스탕스를 지원하는 등 불꽃같은 삶을 살다 34살에 영양실조와 결핵으로 사망했다.
‘중력과 은총’은 그런 삶 속에서 그가 느끼고 깨달은 내용을 담은 잠언집이다. 그는 ‘우리가 낮음(저급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중력의 현상’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낮은(저급한) 쪽에 힘이 있고, 중력은 바로 그 상징이라는 것. 저급한 동기는 고귀한 동기보다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짧은 생애동안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애썼던 철학자였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아래로 자꾸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이고 그 중력에 굴복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다. 중력에 반해 높은 쪽으로 떨어지는 방법은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로만 가능하고 그건 구원이자 은총이다. 시몬 베유는 스스로를 낮춰 은총을 얻으려 노력했다.
그의 글은 구체적이며 노골적이다. ‘더럽히기, 그것은 바꾸기, 만지기다. 우리가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장악하고 힘을 행사하면 더럽히게 된다. 소유하면 더럽힌다. 순수하게 사랑하기, 즉 자기가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 사이의 거리를 받아들이기, 그 거리를 소중히 여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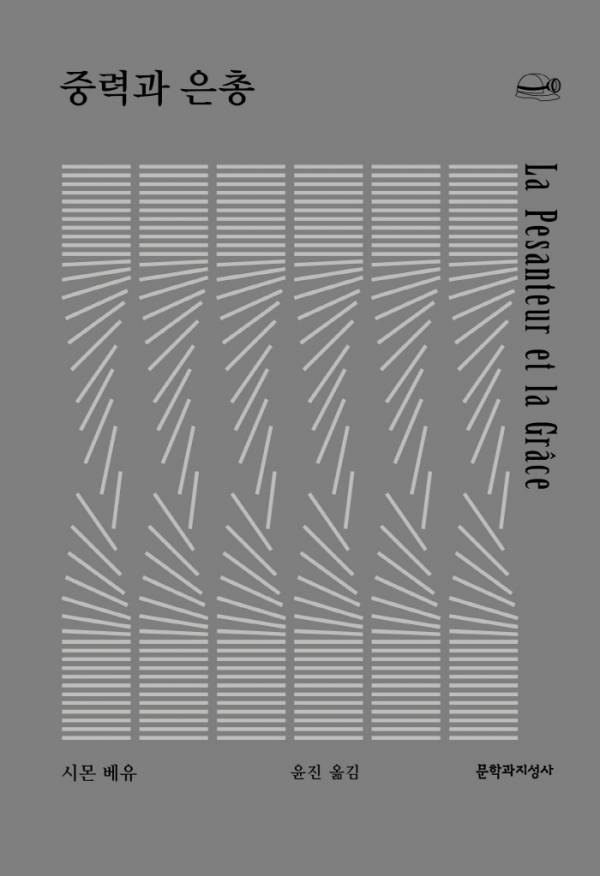
‘중력과 은총’은 시몬 베유 사후에 출간됐다. 삶이 그랬듯 글 역시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읽거나 듣는 이의 기분을 살피지도 않는다. 그게 누구거나 어느 쪽이든.
‘부자나 권력자들은 인간의 비참함을 알기 어렵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 역시 인간의 비참함을 알기 어렵다. 부자와 권력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의 글은 읽는 이의 마음을 찌른다. 사실이지만 아무도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 내면의 심리, 아프고 슬픈 구석을 콕 짚어 밖으로 꺼내 놓는 까닭이다.
‘억압이 어느 정도의 단계를 넘어서면 노예들은 필연적으로 강자를 숭배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노리개가 돼 전적으로 강제에 묶여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제를 벗어날 수단을 잃어버린 사람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원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복종이 아니라 헌신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럴 땐 해야 하는 것 이상을 해내려 노력하게 된다. 그러면 고통이 줄어든다.’
‘반항은 즉시 분명하고 효과적인 행위로 옮겨진다면 모를까 언제나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반항에서 야기된 무력감이 굴욕을 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억압 받는 자의 무력한 반항은 억압을 가하는 자의 주된 발판이 된다. 헌신이라는 거짓은 노예 뿐 아니라 주인까지 속인다.’
베유의 글은 그러나 읽다 보면 가슴 속 깊이 감춰져 있던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게 만든다. 노동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낮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걸출해서 외로웠던 여성의 통찰이 담긴 잠언은 정치적인 수사로 가득한 남성의 잠언과는 또 다른 울림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