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의 어떤 시’ 모음집 『안녕 내 사랑』

‘나는 없던 입이고, 지워진 입이고, 처음 생겨난 입이고, 더듬거리는 입이고, 소리치는 입이고, 지금은 독백을 중얼거리는 입이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이성미(1967~) 시인의 산문시 ‘참고문헌 없음’의 일부다. 최영미 시인은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다. “어떤 독백도 공허하지 않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이라고. 문장은 이어진다. “우리 사회는 미투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시인이 동서고금의 명시 50편을 해설과 함께 엮은 책 ‘안녕 내 사랑’(이미출판사)을 내놨다. 일간지에 연재했던 ‘최영미의 어떤 시’ 모음집이다. 기원 전 2800년께 인물이라는 길가메시부터 이백과 두보, 예이츠, 바이런, 최치원, 김시습, 정약용, 윤동주 그리고 생존시인인 신경림, 김용택, 천양희, 최승자, 이성미까지 망라했다.
대부분의 시는 길지 않고 해설 또한 짤막하다. 시인의 삶과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시인과의 인연을 적거나 한두 줄 촌평을 곁들이는 식이다. 반만년 동안 씌여진 시들 중에서 그가 고른 것은 세상살이의 안타까움과 외로움, 사랑의 절절함을 다룬 작품들. 어느 것을 읽어도 잠시 숨 죽이고 허공을 응시하게 되는 이유다.
‘모두들 봄 꾀꼬리의 고운 소리만 사랑하고/ 가을 매 거친 영혼은 싫어들 하오/ 세파 속을 헤매면 웃음거리 될 뿐/ 곧은 길 가려거든 어리석어야 하지요.’ 통일신라 시대 시인 최치원(857~?)의 ‘곧은 길 가려거든’엔 이런 해설을 붙였다. “이 시를 쓰고 4년 뒤 최치원은 신라로 귀국했다. 나쁜 세상, 어지러운 신라를 구하고자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여조‘를 적어 올렸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그는 외로운 구름이 되어 전국을 유람했다.”
‘향수로 머리 감았다 해서/ 갓 티끌 튕기지 말 것이며/ 난초 담근 물로 몸 씻었다 해서/ 옷 먼지 털지는 마소/ 사람 사는 세상 지나친 결백은 삼가나니/ 도에 지극했던 사람들/ 제 본색 감추기를 귀히 여겼더라네.’ 이백(701~762)의 ‘목욕하는 사람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겼다. “지나친 결백은 나에게도 불편하고 타인에게도 불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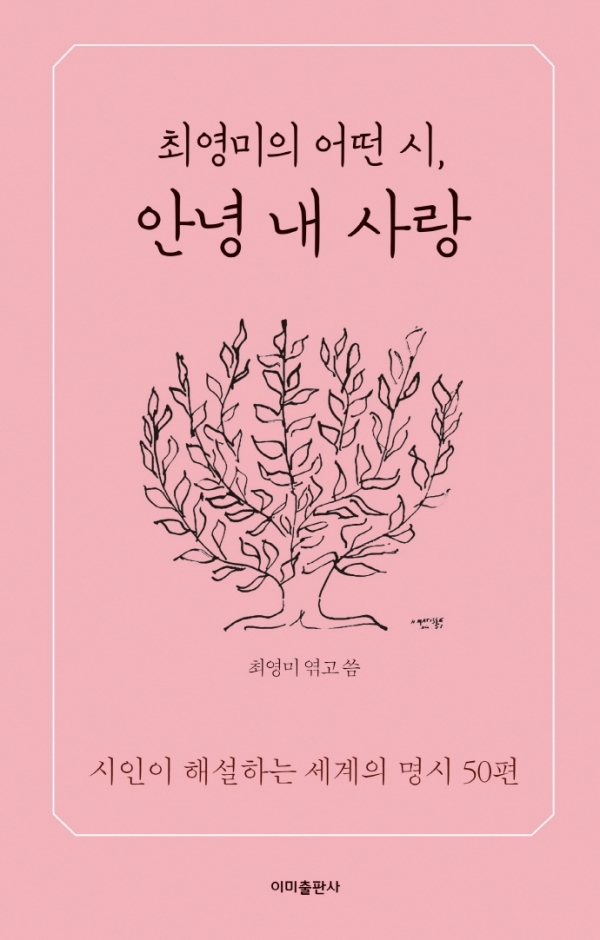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시도 빼놓지 않았다. ‘애비가 검소하면 자식이 방탕하고/ 아내가 영리하면 남편이 어리석네./ 달이 차면 구름을 자주 만나고/ 꽃이 피면 바람이 불러 날리네/ 모든 사물 이치가 이와 같은데 아는 사람 없음을 홀로 웃노라.’ ‘혼자 웃다’라는 시인데 다산이 1804년 7월 유배지 강진에서 쓴 것이라며 “사회와 인생의 모순을 정확하게 묘사한 시와 산문, 그 치열한 사실주의를 나는 사랑한다”고 적었다.
김시습(1435~)의 ‘겨울파리’편은 시도 해설도 명쾌하다. ‘더위엔 호기롭고 장하더니만/ 찬 서리에 풀 죽어 설설 긴다네/ 단청 기둥에 점 하나 되고/ 흰벽 위 까만 사마귀 점 되어/ 쓸모없는 얇은 날개로/ 모퉁이에 천한 흔적 하나 남겼거늘/ 때 얻었다 방자하지 말라/ 권세 다한 뒤 그 누구를 원망하랴.’ 해설은 이렇다. “불우한 지식인의 환멸과 체념의 몸짓이 때로 지겨웠는데 ‘겨울 파리’는 신선했다.”
어지러운 세상을 헤맨 건 동양의 옛시인에 그치지 않는 듯.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의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마당의 구부러진 나무가/ 토질 나쁜 땅을 가르키고 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으레 나무를/ 못생겼다 욕한다.’ 브레히트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으로 유명한 시인이다. 최 시인에 따르면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언어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이별은 아프다. 최승자(1952~) 작 ‘기억하는가’의 후반부는 단 두 문장이다. ‘네가 전화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네가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평생을 뒤척였다.’ 해설도 간단하다. “서로 사랑해 행복해 죽겠다는 시 중에 세계의 명시가 있는지.“
최영미 시인은 서울 태생으로 대학에서 서양사,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1992년 시집 ‘서론, 잔치는 끝났다’를 발표하면서 주목 받았다. 이후 시집 ‘꿈의 페달을 밟고’ ‘돼지들에게’ ‘이미 뜨거운 것들’과 장편소설 ‘흉터와 무늬’, 산문집 ‘시대의 우울’ 등을 냈다. 시 ‘괴물’ 등 창작활동을 통해 문단 내 성폭력과 남성 중심 권력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한 공로로 2018년 '서울시성평등상' 대상을 받았다.
그는 책 후기를 통해 “시에는 시간과 고통을 견디는 힘이 있다”고 얘기했다. 고심에 고심을 더해 골랐을 시도 그렇고, 간결하나 핵심을 찌르는 해설도 가슴을 찌른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듯하거나, 사랑을 잃고 무너졌거나, 반향 없는 외침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시의 힘이 가 닿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