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이 키운 13년 이상 장뇌삼만 채심
산삼에 버금가는 사포닌 함유
범두뫼에서 장뇌삼을 만나다

산삼은 귀하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 산삼을 대신할 수 있는 약초는 없을까. 40여년 자연과 함께해온 심마니 산약초꾼 윤재정(사진)은 ‘장뇌삼’이라고 강조한다. 20여년전 뿌려놓았던 장뇌삼 중 13년 이상 된 삼만 채심해 브랜드 ‘범두뫼’를 통해 소비자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윤재정 심마니를 만났다.
그의 사업장은 포항 죽장면 해발 600m 고지에 있어 한 여름이라도 산 밑의 기온과는 3~4도 차이가 있었다. “보통 우리가 칭하는 산삼은 자연 발아한 산삼의 씨가 또 발아해서 자란 것입니다. 인간의 손을 떠나 40년이 지나야 산삼이라고 칭합니다. 산삼과 장뇌삼은 사포닌 덩어리로 항맘, 노화방지, 면역력 증강에 최고로 꼽힙니다. 오래된 산삼보다는 못하지만 장뇌삼에는 인삼보다 5~8배 이상 사포닌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여년 전 산삼의 효능에 버금가는 장뇌삼을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에 장뇌삼을 심을 자리를 찾아 다녔다. 40년 동안 산삼을 찾아다니며 터득한 지식을 토대로 어렵게 찾은 자리에 씨를 뿌리고 심었다.
“씨를 심은 것은 저이지만 키운 것은 자연입니다. 그렇게 자란 장뇌삼을 올해 처음으로 채취했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과 자연적으로 자란 것은 잎과 줄기의 모양이나 색깔이 다르고 뿌리의 생김새도 틀립니다.”
산삼의 씨앗을 야생에서 자연 발아시킨 것이 장뇌삼이다. 그래서 장뇌삼을 자연에서 키우려면 먼저, 산이 비옥해야하고 잡목나무와 부엽토가 많아야 하며 방향은 북쪽, 공기도 서늘한 곳이라야 한다. 산삼은 음지식물이라 더운 곳보다는 추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장뇌삼을 기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일반 밭에 씨를 뿌려 차양막을 쳐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과 산에 밭을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산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윤재정 심마니는 산에 씨앗을 심어 장뇌삼을 기르고 있다. 인위적으로 대량 생산된 장뇌삼은 시장에서도 구하기 쉬워졌으나 자연에서 키워진 장뇌삼은 여전히 구하기 쉽지 않다.
“농약이나 비료를 준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자란 것이 더 좋겠지요. 장뇌삼은 뇌두와 잔뿌리의 정도를 보고 나이를 가늠하는데 몸통이 줄어들면서 뇌두로 가기 때문이고 오래된 삼일수록 잔뿌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는 13년이 지난 장뇌삼만 채심한다. “범두뫼 장뇌삼만의 경쟁력”이라는 설명이다. “장뇌삼이나 산삼은 10년이 되면 약성이 들어옵니다. 장뇌삼도 오래될수록 좋긴 하지만 각자의 형편들이 다르니 부담은 적고 약효는 좋지요.” ‘범두뫼’는 범(호랑이)이 자주 출몰 할 정도로 깊은 두메산골을 뜻한다. 그의 고향산천 지명이다. 윤재정 심마니는 “자연의 가치와 진심을 ‘범두뫼’에 담아 건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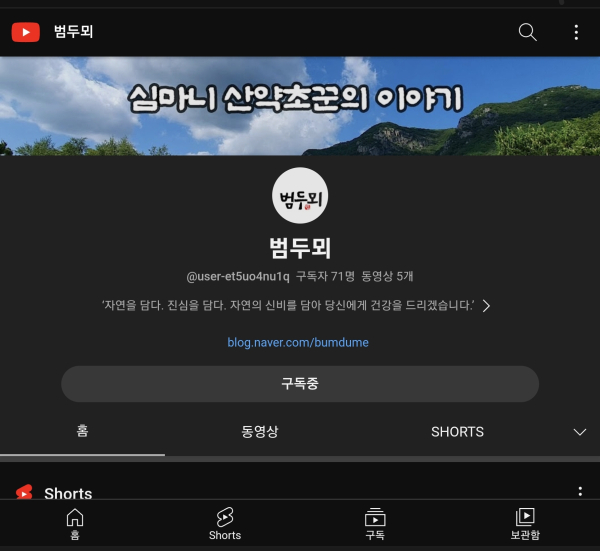
산삼을 찾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깊고 가파른 산자락, 크고 작은 나무와 넝쿨, 낙엽과 바위 등 장애물이 많아 한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어 산삼산행은 늘 신경이 많이 쓰이기 마련이다.
“고패삼이 올라오는 4월 중순부터 10월 황절까지 산삼 산행이 이어져요. 한번 산에 가면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지내는데 산삼을 채취할 확률은 70~80%입니다. 구광자리의 힘을 빌리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아는 자리가 많은 덕분입니다.”
산삼을 발견하면 약성이 든 오래된 산삼만 가져오고 어린 삼들은 그냥 두는데 그 자리를 구광자리라고 부른다.
“저는 10년 정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갑니다. 다른 심마니들이 찾아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장뇌삼도 그런 마음으로 20여년을 자연에게 맡겨 온 것입니다.”

